K-유행은 이제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한국에서 시작된 이른바 ‘두바이 쫀득 쿠키’는 중국과 일본까지 빠르게 확산되며 아시아 전역에서 소비되고 있다. 마치 한 나라 전체가 거대한 팝업 스토어이자 쇼윈도처럼 기능하는 모습이다.
이 유행의 확산 속도는 콘텐츠보다 빠르고, 맛보다 앞선다.
유행은 더 이상 충분히 검증된 ‘완성품’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트렌드의 베타테스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소비와 노동의 경계가 흐려진다.
베타테스터가 된 소비자들
새로운 디저트가 등장하면, 그 자체의 완성도보다 먼저
“지금 유행하느냐”가 소비의 기준이 된다.
SNS에 올라온 사진, 줄 서는 풍경, ‘품절’이라는 단어는
맛을 설명하는 어떤 문장보다 강력하다.
그래서 어떤 댓글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다.
“흡사 임상실험 같다.”
우리는 먹어보며 평가하고, 사진을 올리고, 반응을 만들며
다음 유행으로 넘어간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장 테스트를 끝내는 셈이다.
왜 하나만 사지 못할까
흥미로운 지점은 소비 방식이다.
김치만두, 고기만두, 새우만두가 나란히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만 사지 않는다.
“세 가지를 다 사 와서 나눠 먹는 것”이 이미 학습된 소비 패턴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제과점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쫀득 쿠키 하나만 맛보는 대신,
여러 버전의 쿠키를 함께 사게 되고
결과적으로 객단가와 매출은 더 높아진다.
유행은 이렇게 선택을 늘리는 척하면서 소비를 증폭시킨다.
꼭 피스타치오여야 할까
두바이 쫀득 쿠키의 핵심 재료로 알려진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는 비싸고, 품귀 현상까지 겹쳤다.
하지만 정말 그 재료만이 정답일까?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맛있고, 더 합리적인 재료는
충분히 많을 것이다.
문제는 맛이 아니라 ‘유행의 공식’을 얼마나 빨리 복제하느냐다.
재료는 중요하지 않다.
이름, 이미지, 희소성, 그리고 타이밍이 전부다.
냄비근성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왜 한국에서만 유독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한국처럼 유행에 민감한 나라가 또 있을까?”
이 질문은 개인의 취향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
빠른 인터넷, 높은 SNS 침투율,
그리고 ‘놓치면 뒤처진다’는 집단적 감각.
이 모든 조건이 합쳐져 대한민국은
트렌드를 실험하고 소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딱 설 연휴까지 갈 유행 같다.”
그 말은 가볍지만 정확하다.
유행의 끝에서 남는 것
소금빵 하나만 먹어본 사람은
어쩌면 불쌍한 게 아니라,
유행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난 사람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유행을 시험 중이다.
다음은 또 무엇일까.
확실한 건,
우리는 여전히 가장 성실한 베타테스터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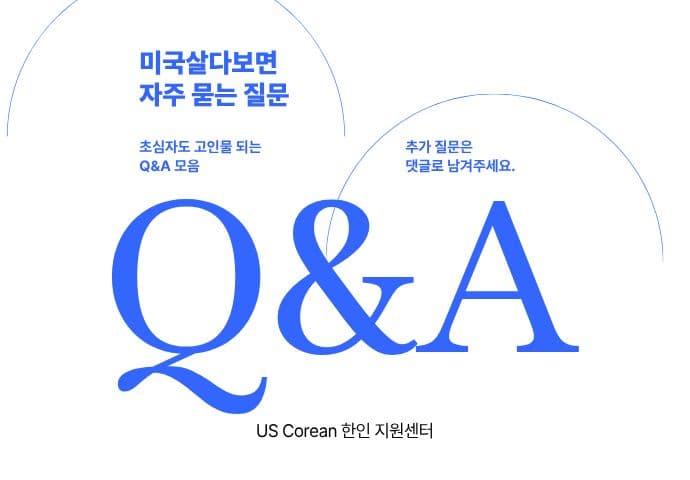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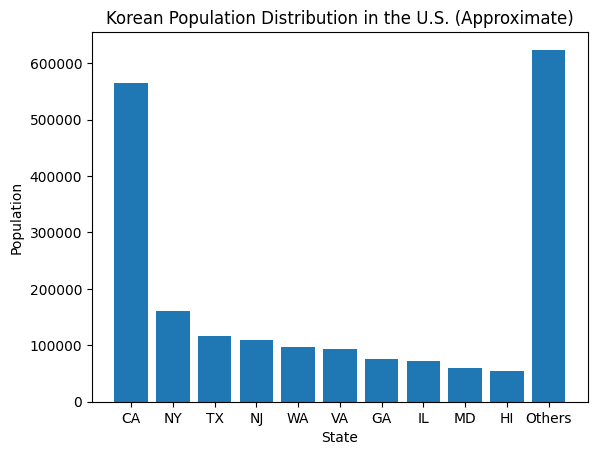








Responses (0 )